우리은행이 지주사 전환의 기반을 닦기 위해 자본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주회사가 출범 초기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자본 적정성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 지속적으로 공을 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의 기반 닦을 자본확충에 속도내]()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주사 전환을 준비하며 자본금을 쌓기 위해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을 연달아 발행하고 있다.
지주사 전환을 공언한 뒤로 후순위채권을 5월 2천억 원, 7월 3억 달러(약 3천3백억 원), 신종자본증권을 7월 4천억 원 발행했다.
우리은행이 지주사로 전환해 비은행 계열사를 더 확보하려면 현금자산이 더 필요한 데다 지주회사의 총자기자본비율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채권 발행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후순위채권과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돼 금융회사들이 자본 확충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은행 지분을 50% 이상 들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는 국제결제은행(BIS) 바젤Ⅲ기준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반영해 총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14% 수준을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 총자기자본비율이 15.3%지만 지주사로 전환하고 자회사 자본금까지 반영하면 총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리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기업 인수합병 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려면 자본 적정성을 기준 이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9년에는 바젤Ⅲ기준이 강화돼 총자기자본비율과 별도로 자본보전완충자본비율이 신설돼 2.5%를 추가로 쌓아야 한다.
그러나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 모두 실질적 성격은 부채인 만큼 채권 발행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다.
우리은행은 사업 수익성 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고 자회사 편입에 쓰일 자금을 마련하는 데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은 금리에 따르는 조달비용이 발생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조달비용은 계속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후순위채권은 만기가 5년 안으로 가까워져 오면 회계상 자본에서 부채로 편입돼 이를 보충할 방안도 필요하다.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말고 내부 유보금으로 쌓아두는 것도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은행은 6월 이사회에서 중간배당을 의결하지 않으면서 지주사 전환을 위한 내부 유보금을 보태기도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실적 호조가 지속돼 신종자본증권 등을 성공적으로 발행할 수 있었고 해외와 국내의 여건을 감안해 발행 규모도 적절히 배분했다"며 "앞으로 은행을 비롯한 모든 계열사의 수익성을 높여 지주사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지주회사가 출범 초기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자본 적정성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 지속적으로 공을 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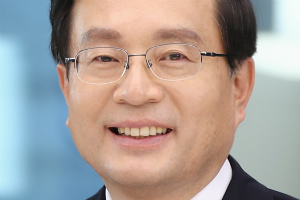
▲ 손태승 우리은행장.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주사 전환을 준비하며 자본금을 쌓기 위해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을 연달아 발행하고 있다.
지주사 전환을 공언한 뒤로 후순위채권을 5월 2천억 원, 7월 3억 달러(약 3천3백억 원), 신종자본증권을 7월 4천억 원 발행했다.
우리은행이 지주사로 전환해 비은행 계열사를 더 확보하려면 현금자산이 더 필요한 데다 지주회사의 총자기자본비율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채권 발행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후순위채권과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돼 금융회사들이 자본 확충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은행 지분을 50% 이상 들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는 국제결제은행(BIS) 바젤Ⅲ기준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반영해 총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14% 수준을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 총자기자본비율이 15.3%지만 지주사로 전환하고 자회사 자본금까지 반영하면 총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리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기업 인수합병 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려면 자본 적정성을 기준 이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9년에는 바젤Ⅲ기준이 강화돼 총자기자본비율과 별도로 자본보전완충자본비율이 신설돼 2.5%를 추가로 쌓아야 한다.
그러나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 모두 실질적 성격은 부채인 만큼 채권 발행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다.
우리은행은 사업 수익성 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고 자회사 편입에 쓰일 자금을 마련하는 데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은 금리에 따르는 조달비용이 발생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조달비용은 계속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후순위채권은 만기가 5년 안으로 가까워져 오면 회계상 자본에서 부채로 편입돼 이를 보충할 방안도 필요하다.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말고 내부 유보금으로 쌓아두는 것도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은행은 6월 이사회에서 중간배당을 의결하지 않으면서 지주사 전환을 위한 내부 유보금을 보태기도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실적 호조가 지속돼 신종자본증권 등을 성공적으로 발행할 수 있었고 해외와 국내의 여건을 감안해 발행 규모도 적절히 배분했다"며 "앞으로 은행을 비롯한 모든 계열사의 수익성을 높여 지주사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코스피 5천 그늘①] 증시 활황에도 못 웃는 LG그룹, 구광모 '체질 개선'과 '밸류업'으로 저평가 끊나](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2/20260209151542_142553.jpg)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KT 이사회 뭇매가 기대를 낳는 이유,](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511/20251106153113_81318.jpg)

![[여론조사꽃]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양당 지지층 70% 안팎 '찬성'](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2/20260209104958_80899.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