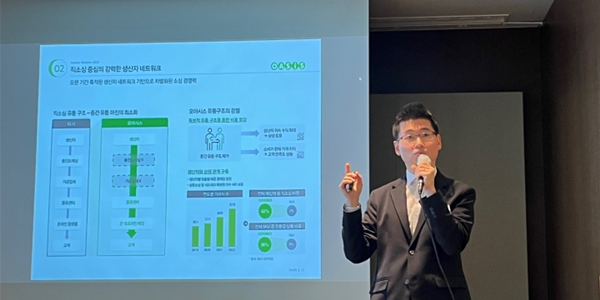!["주식 사라고 할 수 있다" 자신한 오아시스, 상장 문턱에서 왜 발길 돌렸나]()
| ▲ 오아시스가 상장 추진을 중단한 이유는 상장을 초기부터 반대해온 일부 기존 투자자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준형 오아시스 대표이사(사진)가 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아시스> |
[비즈니스포스트] "오아시스 주식을 사라고 추천하지 못한다면 상장도 못 합니다. 전 오히려 주식을 더 사고 싶은걸요."
오아시스 고위 관계자가 8일 상장 관련 기업설명회 당시 했던 말이다. 오아시스가 스스로 책정한 기업가치 약 1조 원을 놓고 몸값이 부풀려진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그만한 기업가치를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오아시스는 결국 상장 문턱에서 발길을 돌렸다.
오아시스가 기업공개 추진을 중단한 표면적 이유는 '수요예측 실패'다. 하지만 이전부터 기존 투자자 사이에서 상장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기업공개와 관련해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오아시스가 13일 한국거래소에 상장 철회신고서를 낸 주된 이유는 상장 추진과 관련해 일부 투자자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아시스는 7~8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이 끝난 뒤 내부적으로 상장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할지, 중단할지를 놓고 오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에 상장 계획을 중단한다는 철회신고서를 낸 13일 당일에도 이사회를 여는 등 기존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는 것이 오아시스 관계자의 말이다.
오아시스에 자금을 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모가를 낮춰서라도 계획한 대로 상장을 추진해도 된다는 데 긍정적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가 끝까지 상장 강행에 반대 의견을 낸 탓에 결국 계획을 접은 것으로 파악된다.
오아시스 관계자는 "상장을 하겠다는 회사의 의지가 강력했고 기존 투자자 대부분도 이런 회사의 의견에 공감했지만 일부 투자자가 난색을 표했다"며 "기존 투자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상장 일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아시스는 상장을 추진하면서 속도전을 펼쳤다.
한국거래소에서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날이 지난해 12월29일이었는데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은 1월12일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코스닥 상장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 상장예비심사를 받고 수 개월 동안 시장 상황을 살피다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시기에 골라 상장을 추진하는 다른 회사들과 달리 의사결정 속도가 꽤 빨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아시스에 투자했던 기존 투자자 가운데 일부가 다른 의견을 낸다는 소리도 심심찮게 들렸다.
오아시스가 7일 공개한 투자설명서를 보면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었다는 점이 증명된다.
오아시스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던 1월12일 당일 이사회를 열고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및 구주매출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올렸는데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유일하게 김수민 기타비상무이사가 반대표를 던졌다.
김수민 기타비상무이사는 2021년 10월14일 오아시스 이사회에 합류한 인물이다. 사모펀드 유니슨캐피탈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있다.
유니슨캐피탈코리아가 2021년 7월 오아시스에 500억 원의 투자를 진행하면서 김 대표도 오아시스 이사회에 합류했다. 통상 사모펀드는 투자를 집행한 스타트업의 이사회에 기타비상무이사와 같은 형태로 진입한다.
김 대표가 상장에 반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오아시스가 상장에 도전한 뒤 이를 철회하는 과정을 종합해봤을 때 최근 환경이 기업공개를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유니슨캐피탈코리아가 오아시스에 투자를 진행할 때 책정했던 오아시스의 기업가치는 약 7500억 원이다. 오아시스가 공모가를 낮춰 상장을 진행한다면 재무적투자자로서 투자 손실을 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상장을 강하게 반대했을 수 있다.
오아시스가 13일 철회신고서를 내기 전까지도 유니슨캐피탈코리아는 상장에 계속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된다.
공모가를 낮춰서 상장해도 된다고 판단한 기존 투자자들이 유니슨캐피탈코리아를 설득하기 위해 나섰지만 유니슨캐피탈코리아가 법적 문제를 거론하면서까지 강경하게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이 투자금융업계 관계자의 얘기다. 남희헌 기자